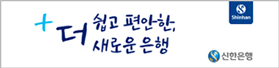나눔의 행복
김풍배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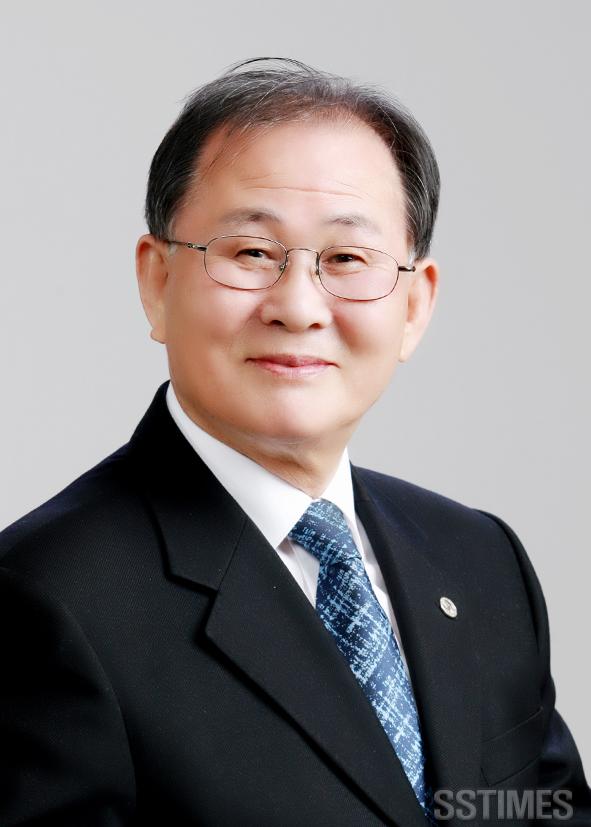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어 희망을 잃지 않는다. 석 달 열흘 가뭄에 아침 이슬 같은 소식들이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의 통 큰 기부 소식을 들었다.
두 기업가는 어려운 형편을 딛고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많은 재벌이 후손에게 가진 편법과 수단을 다하여 부를 물려주는 관행을 깨고 자기 재산의 절반인 5조 원과 5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한 편의점에서 선행을 베푼 여학생의 이야기도 있다. 남편과 사별하고 빚더미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주부의 어린 둘째 아들이 편의점에서 몇 가지 먹을 것을 샀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었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어느 여학생이 그 물건 외에 다른 것도 사줬다는 이야기다. 여학생이 대신 계산해 준 돈이 5만 원 상당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감사하다는 말과 월급이 나오면 갚겠으니 연락해달라는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는 이야기였다.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이다. 꽁꽁 언 땅을 뚫고 노랗게 솟아오른 복수초꽃처럼 아름답고 예쁜 소식이다.
또 다른 나눔도 있었다. 치킨집 사장님의 ‘한 접시의 치킨’ 이야기다. 치킨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소년 가장은 5천 원을 들고 거리에 나섰지만 치킨 5천 원을 파는 가게는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점주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 했고 이들에게 2만 원어치의 치킨을 주고 돈도 받지 않고, 이후 가끔 찾아오는 일곱 살 동생에게 배불리 치킨을 먹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도 잘라 주었다고 했다. 이를 알게 된 학생은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장님 덕분에 그날 치킨집을 나오고 많이 울었다며 그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본사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다고 했다.
“저도 성인이 되어 돈 꼭 많이 벌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철인 7호 홍대점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는 경제 한파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이러한 때의 나눔은 더 밝고 빛이 난다. 귀 기울여 보면 이런 따뜻한 나눔의 소식들은 뜻밖에 많다. 다만, 조그만 불빛이 멀리 가지 못할 뿐이다. 30억 원을 기부한 전종복‧ 김순분 부부라든가 대하장학재단 명위진 이사장, 구두 수선공 김병량 씨 등등 올해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이다.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고, 기를 쓰고 출세하려 하며, 더 많은 걸 소유하려 드는 건 무엇 때문일까?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터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행복 때문일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어 돈 벌고, 출세하고, 권력 잡고,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는 일시적 행복은 가져다줄지언정 다함이 없다. 끝없는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자꾸만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렇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바로 나눔이라고 말하고 싶다.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란 말이 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추구하고 찾아내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김범수 의장이나 김봉진 의장처럼, 전종복 부부처럼, 명위진 이사장처럼 그렇게 거액을 나눌 수는 없다. 그렇게 통 큰 기부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위대함을 찬탄할지언정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는다. 오히려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줬다든지 2만 원의 치킨을 사줬다는, 어쩌면 사소하고 작은 나눔에 대하여 더 진하게 감동하게 된다.
스스로 돌아본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를 들으며 그냥 지나쳤다. 기다란 고무장화를 신은 장애인의 구슬픈 경음악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외면했다, 살아오며 인색했던 갖가지 일들이 떠오른다. 채우는 행복보다 비움의 행복이 더 크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시인ㆍ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