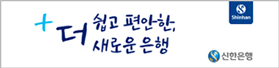겨울 초입에 접어든 농촌들녘이 을씨년스럽다. 풍년을 노래하고 흥청거려야 될 농업인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울부짖고 있다.
농민대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컨테이너로 방어 벽을 쌓고, 차들이 불타고, 농민과 경찰이 서로 몽둥이와 방패를 휘두르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재미 삼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문제의 근본은 외면한 채 충돌하고 있는 모습만 주목한다면 농업문제의 해답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속담에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農夫餓死 枕厥種子 : 농부아사침궐종자)’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 한민족은 곡식 특히 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쌀은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식량안보의 중핵이다.
쌀 개방은 90년대 초반부터 예상됐고 93년 UR 협상이후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농업분야에 쏟아 부었지만 남은 것은 농가의 부채와 노인만 남은 농촌이 됐다. 농촌은 산업화와 개방이라는 파고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있다.
수입농산물이 식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으로 인해 당장 내년이면 외국산 쌀밥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내리게 됐다.
쌀까지 내주게 됐으니 이제 우리의 밥상은 거의 모두 값싼 외국 농산물로 채우게 된 셈이다. 이제는 외국쌀과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하다. 수긍이 가는 얘기다.
외국쌀에 비해 값은 비싸지만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만 먹겠다”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국산 쌀의 안전성과 품질은 높이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은 대다수가 60, 70대 노인들이다. 늙은 농업인에게 고품질 농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동안 “농업인의 생존권을 좌우할 쌀 협상 국회 비준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쌀 농업은 물론 한국농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농업인의 외침은 지금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피땀흘려 지은 벼를 불태우며 쌀 비준을 막아보려 했던 농민들의 힘은 절대권력 정부와 국회의 권력 앞에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졌고 거리로, 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란’은 백성들이 극도로 피폐해졌을 때 일어난다.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목숨을 부지할 해답이 없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대항하여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드는 것이다.
땅을 향해 내리쳐야 할 곡괭이를 탐관오리에게 휘두르는 것은 목숨을 건 마지막 항거인 것이다. 1862년에 일어났던 임술민란. 산청 단성에서 서막을 알린 이 민란은 삼정의 문란에서 비롯됐다. 환곡 때문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농가에 관속들의 가렴주구는 끊이지 않았으니 죽지 못한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관청을 습격하고야 만 것이다.
‘갑오동학농민항쟁’도 마찬가지였다. 1892년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겨 재산을 빼앗고 온갖 죄명을 씌워 재물을 약탈하니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녹두장군 전봉준을 앞세워 이듬해 정월 봉기하고 만 것이다.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실정은 조병갑 같은 무리가 가렴주구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관리는 없지만 농민들은 목숨을 담보해야 할 정도의 척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 농업대출을 받아가며 농사를 지어보지만 남는 게 없다. 농사를 짓는다는 ‘죄’ 하나만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갈등하다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마는 농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죽지 못한 농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성난 농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농민의 모습은 오히려 애원에 가깝다.
APEC에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자유무역을 거론하고 WTO에선 농산물(쌀)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정부는 농업을 버렸다.
대다수 농민들은 일년 농사를 지어도 연봉 천 만원이 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는 처지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이 농촌에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도 아니다.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들이 매일같이 농민대회를 열면서 정부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이처럼 절박하기에 그 옛날 ‘민란’을 닮았다.
논밭의 환경적 영향은 굳이 강조하고 싶지도 않다. 생명산업이라는 말도 꺼내기 싫다. 지난 23일 쌀협상 국회 비준 후 정부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리를 높였지만 밥상을 다 내준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소득을 놓이겠다는 것인지 농민들의 귀에는 더 이상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